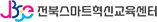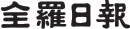김제시가 고령화와 업무 증가로 행정 인력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공무원 1명이 감당해야 할 면적은 넓어지고, 농촌·산단·취약지 관리 업무까지 빠르게 늘고 있지만 인력 충원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장 행정에 투입할 수 있는 기술’로서 드론이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단순 기술 시범이 아니라 행정 공백을 메우고 예산까지 절감하는 실전형 모델로서 도입 필요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주상현 김제시의원은 “김제처럼 평야가 넓고 농업·환경 관리 수요가 큰 도시일수록 공무원 수를 늘리는 방식만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사람이 일일이 다니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즉시 전력화가 가능한 드론을 행정에 적극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불법소각 단속, 광범위한 농경지 모니터링 등은 “드론 한 대가 수십 명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드론의 행정 효과는 이미 입증된 바 있다. 남원시는 2025년 실증사업에서 드론 영상에 AI 분석을 결합해 약 167ha에 달하는 미재배 면적을 정확하게 찾아냈다. 전체 농지의 11%에 해당하는 규모다. 사람이 현장을 직접 확인했다면 놓칠 가능성이 높았던 사각지대를 드론이 포착하면서, 약 1억7천만 원의 보조금 누수를 막을 수 있었다. 장비를 넘어 ‘예산 감시자’ 역할을 해낸 사례다.
필요성은 소방 현장에서 더욱 뚜렷하다. 김제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위험물 사고, 실종자 수색 등 초기 대응에서는 드론의 관측 한 번이 진입 방향과 대응 전략을 완전히 바꾼다”며 “특히 넓은 농촌 지역에서는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지만 장비와 운용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예산이 부족해 도입이 지연되는 사이, 현장이 체감하는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누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다. 전문가들은 기관별로 드론을 따로 구매해 운영하는 방식보다, 지자체·소방서·경찰이 공동으로 장비를 확보하고 상황에 따라 가장 가까운 기관이 즉시 투입하는 ‘통합 드론 운영체계’가 현실적이라고 분석한다. 한정된 예산으로 고성능 장비를 확보하면서도 행정·치안·재난 대응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김제시가 추진 중인 ‘피지컬AI 실증단지’와 연계될 경우, 드론은 단순 감시 장비를 넘어 재난 대응·환경 감시·농업 분석까지 통합 지원하는 지역 기술 플랫폼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인력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기술로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을 ‘핵심 행정 자원’으로 삼아 행정 방식 자체를 전환하는 접근이다.
남원시 사례에서 보듯 예산 절감과 행정 효율을 동시에 잡는 길은 이미 확인된 만큼, 이제 남은 과제는 김제시의 실제 도입 의지다. 고령화와 업무 폭증이라는 벽 앞에서, 드론 행정은 선택이 아니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적 대안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