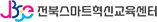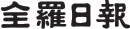현대 사회의 특징을 한 마디로 축약한다면 디지털 시대다. 이를 농업혁명과 산업혁명에 이은 디지털 혁명 혹은 3차 산업혁명이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AI와 로봇 등을 묶어 4차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이들도 있다. 이름이야 어떻든 현 시대에는 디지털화가 대세다. 그리고 여기에 부응한 새로운 조류의 하나가 ‘라이프 플랫폼’ 시대의 도래다. 인간의 삶 자체가 디지털로 완전히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 모든 생활이 플랫폼에 얹어서 가는 방식을 도입한다는 이야기다.
라이프 플랫폼의 주역은 당연히 플랫폼 기업이다. 우리나라로 보면 네이버나 카카오가 가장 강력한 플랫폼이다. 해외로 눈을 돌리면 아마존이나 구글 등이 핵심 역할을 한다. 이들 기업의 확장은 끝이 안 보인다. 갖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최종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해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그런데 플랫폼 기업만 비즈니스 영역을 넓혀가는 것이 아니다. 유통이나 물류 그리고 모빌리티 기업들도 라이프 플랫폼 시대에 적극 활약하고 있다. 또 삼성이나 현대차 등 제조업 분야 대기업들도 개인 맞춤형 서비스나 구독 모델 등을 통해 이 시장에 접근하는 중이다. 그러니까 소비자를 상대하는 거의 모든 기업들이 라이프 플랫폼 시대 주인공을 목표로 나아가는 것이다.
예를 들면 편의점 업계는 거의 전방위로 업역을 확대하고 있다. 동네 생필품 구매 공간을 벗어나 금융, 의류와 화장품 판매, 배달 서비스 도입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모양새다. 온라인 커머스가 저가격으로 공격해오자 편의점들은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경험 콘텐츠에 공을 들이는 중이다. 전국에 촘촘히 형성된 유통망과 접근성을 앞세운 전략이다. 소비자의 일상 전반을 책임지는 라이프 플랫폼으로 거듭 나겠다는 의도다.
최근 K-뷰티 시장이 라이프 플랫폼 전장이 되고 있다는 보도다. 패션 중심 플랫폼이던 무신사가 새롭게 뷰티 전용 오프라인 매장을 만든다고 한다.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진출하며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하겠다는 의도다. 이렇게 되면 뷰티 시장은 기존의 올리브영·다이소에 이어 삼각 구도를 형성하게 된다. 무신사가 뷰티 시장에 등판한 것은 지난해 다이소 뷰티 부문 매출이 전년 대비 144% 급증하는 등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몇 년 전부터 치열한 플랫폼 경쟁이 전개되자 비즈니스 경계는 이미 무너졌다고 보고 있다. 저마다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쿠팡이나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 민족 등의 서비스 영역을 규정하는 것이 무의미한 일이 돼 버린다. 기업들은 이 경쟁에서 낙오하면 죽는다는 사즉생 각오로 나서고 있다. 결국 승부를 가르는 요인은 어떤 플랫폼이 소비자가 필요로 하고 또 선호하는 가치를 제공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