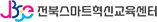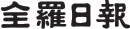교원 3단체가 최근 발표한 고교학점제 학생 의견조사는 여러 가지를 되짚어보게 한다. 이 제도가 ‘선택권 확대’라는 명분과 달리, 상당수 학생에게는 낙인과 압박의 제도로 작동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어서다. 미이수와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에 대해 학생 10명 중 6명이 ‘공부를 못하는 학생’ 혹은 ‘문제학생’으로 여겨진다고 답했고, 정작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4분의 1에 그쳤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고, 그에 맞춰 과목을 선택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러나 고1이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절반 이상이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진로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선택과목을 정하게 하고, 뒤늦게 진로가 바뀌면 과목 선택이 발목을 잡는 구조로 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자퇴를 적극 고민했다는 학생이 33.5%에 달했다는 결과는, 고교학점제가 오히려 ‘진로 탐색’이 아니라 ‘진로 포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경쟁 구조는 더 거세졌다. 이동수업 체제 아래에서도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학생이 과반을 넘고, 상대평가로 학생 서열과 경쟁이 강화된다는 응답은 74.3%에 달했다. 여기에 미이수 제도가 결합하면서, 학생들은 “졸업을 못할까 봐”, “차라리 검정고시가 낫다”고 말한다.
선택과목 평가 방식에 대한 요구도 분명하다. 일부 과목의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 학생들은 과반 이상이 찬성했고, 그 이유로 과목 회피 감소와 심리적 부담 완화를 들었다. 진로·융합선택 과목이 상대평가에 묶이는 순간, 학생들은 ‘좋아하는 과목’이 아니라 ‘등급 따기 유리한 과목’을 고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고교학점제가 약속했던 ‘유연한 선택’이 실제 현장에서는 ‘복합불안’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 같아 아쉽다.
학생들에게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고교학점제의 출발점이자 최소 조건이다. 진로·융합선택 과목의 절대평가 전환, 학교 규모에 따른 과목 개설 격차 완화, 공공 진로·선택 컨설팅 시스템 구축 등 구조적 보완책을 서둘러야 한다.
‘낙인과 경쟁 중심의 학점제’가 아니라, ‘선택권과 성장 중심의 학점제’로 재설계하는 것이 교육당국의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