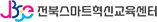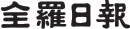2026년 지방선거가 불과 20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선거구 획정 논의는 또다시 표류하고 있다. 법정 시한인 12월 3일까지 남은 시간은 보름도 채 되지 않지만 정치권에서 들려오는 답은 고작 “예산안 처리 후 논의할 것”이라는 무책임한 변명 뿐이다.
헌법재판소의 장수군 광역의원 선거구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선거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국회는 어느 때보다 느긋하기만 하다. 정확히 말하면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입장인 듯 하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선거제도 개편이 논의됐음에도 이 역시 없던 일이 될 공산이 커 보인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이 고착화된 양당 구도 돌파를 위해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역설하고 있을 뿐이다.
전북으로 국한하면 도의원 정수 확대, 즉 인구 상한선 하향 조정은 헌법 불합치 결정과 타 지역에 비해 광역의원 정수가 턱없이 부족한 현 상황을 풀 수 있는 해법이다.
헌재가 제시한 개정 시한은 2026년 2월 19일이다. 이 때까지 국회가 법을 고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은 효력을 잃게 된다. 더 이상 어물쩍 넘길 수 없는, 명백한 시간표가 존재하는 셈이다. 국회 내부에서 이원택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안은 도의원 최소 정수 기준을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낮춰, 장수 문제뿐만 아니라 전북의 구조적 불균형까지 바로잡을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을 담고 있다. 부안·익산·군산 등에서 도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길도 열릴 수 있다.
문제는 결국 정치권의 의지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직접 법안을 검토해 정수를 조정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도의원 정수 확대와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회가 시간을 흘려보낼수록 지역 정치권과 예비 후보자들의 혼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전북이 겪어온 지각 획정의 후유증은 이미 뼈아프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일 47일 전에야 광역의원 정수 조정이 마무리됐고, 기초의원 선거구는 더 늦어져 지역 사회의 혼란과 선거 준비의 차질이 불가피했다. 2010년, 2014년, 2018년 모두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한 ‘만성 지각’은 구조적 병폐가 된지 오래다.
결과적으로 선거구 확정은 특정 정당의 유불리를 따지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절차를 지키기 위한 국가적 책무다.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계산과 핑계가 아니라, 국민 앞에 약속한 기본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성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