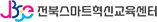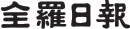전북교육청의 3급 고위직에서 단 한 명의 초등교사 출신도 배출되지 않은 지 23년이 되었다고 한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닌 구조적 불균형의 결과다.
타 지역에서는 초등 출신이 교육국장이나 정책국장에 오르는 것이 이미 낯설지 않은데, 유독 전북만은 예외처럼 굳어져 있다. 그사이 두 명의 교육감이 바뀌었고 교육 환경도 크게 달라졌지만, 이 같은 인사 체계는 흔들림 없이 유지돼 왔다.
전북교사노조가 최근 실시한 설문에서 초등교원 419명 중 97%가 “초등 출신도 교육국장·전주교육장을 맡을 수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육정책의 최종 책임과 방향을 결정하는 요직에 초등 출신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는 교사가 적지 않았다는 점은 더욱 충격적이다. 인사가 조직의 철학을 드러낸다는 점을 감안하면, 많은 부분을 생각하게 한다.
교사의 지역 배치조차 관행적으로 갈리는 문제도 제기된다. 특정 군 지역에는 초등 출신이, 도심 핵심 요직에는 중등 출신이 주로 임명되는 식의 ‘보이지 않는 서열 구조’가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다.
초등과 중등의 학교급 차이는 책임이나 역량의 차이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초등교사는 기초학력·기초생활습관을 전담하며 학부모와 지역사회와의 소통 비중이 높고, 중등교사는 전문교육과 진학지도를 중심으로 한다는 역할 차이가 있을 뿐이다.
교육행정은 두 학교급을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의 조합을 필요로 한다.
특정 출신의 독점 구조는 조직 내부의 신뢰와 동력을 약화시키고, 정책의 균형을 무너뜨린다. 무엇보다 초등 출신 교사들이 애초에 도달할 수 없는 목표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구성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교육행정은 현장과 학교급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며, 이를 인사 시스템에서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공정한 기회와 투명한 인사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전북교육행정은 균형과 포용이라는 가치에 걸맞은 구조로 재편될 수 있다.
마침 차기 교육감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변화는 선언이 아니라 구조에서 시작된다. 이제는 전북교직사회도 응답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