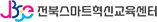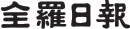세균의 하나인 대장균 오염은 비교적 치료가 쉬운 질병이다. 특별한 치료 없이도 시간이 지나면서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호전된다. 물이나 전해질만으로도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다. 만약 병원성 대장균으로 인해 증상이 심할 경우 1차 항생제를 투여하면 잘 낫는다. 그래서 대장균 오염에 대해서는 별달리 걱정을 안 해왔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항생제가 듣지 않는 내성균이 나타난 것이다. 몇 년 전 국내 종합병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세균 감염 환자 중 무려 43%가 통상 쓰는 항생제에 내성을 보였다. 그러니까 10명 중 4명은 항생제가 듣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아프리카에서는 이 비율이 무려 70%에 달한다는 보고도 있다. 이렇게 되면 치료가 아주 어려워진다. 경우에 따라 2차 항생제가 처방 되지만 값도 비싸고 구하기도 힘들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나 어린이 등은 내성균에 의해 사망할 수도 있다.
항생제가 효력을 못내는 내성균의 등장에는 주요 원인이 있다. 항생제 오남용이다. 항생제를 과다 투여하면 미생물들이 생존을 위해 유전적 변이를 한다. 이것이 내성균이다. 불필요한 항생제를 과다 섭취하거나 이를 의사 처방대로 끝까지 복용하지 않으면 결국 내성균이 나오게 된다. 또 세균이 아닌 박테리아에 항생제를 처방하거나 중복되는 항생제를 중첩해서 쓰는 경우도 오남용 사례다. 상황을 나쁘게 만드는 것은 항생제 개발 속도보다 내성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다. 현대 의학 수준으로 감당이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을 슈퍼박테리아라고 부른다. 이로 인한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다. 유럽의 경우 하루 100명이 내성균에 의해 목숨을 잃는다고 한다. 연간으로 보면 80만명이라고 하니 무서운 일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 추세라면 오는 2050년에는 무려 1천만명의 희생자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항생제 사용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는 통계가 나왔다. 최근 발표된 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항생제 사용량은 인구 1천명 당 하루 31.8DID를 기록했다. 이는 OECD 2위이자 2022년 25.7DID 보다 더 많아진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OECD 평균의 1.36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2019년 항생제 내성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10대 요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부터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ASP)’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자는 프로그램이다. 그렇지만 이 정도로는 우리나라 항생제 오남용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전문인력 확보를 비롯해 의료진의 인식 개선, 국민들의 실생활에서의 실천 등등이 다급한 과제들이다. 발 빠른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사소한 감염마저 치료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새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