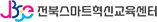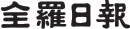2025 전주세계소리축제가 ‘본향의 메아리’를 주제로 문을 열었다.
24년간 이어진 전주세계소리축제의 개막공연은 축제의 시작을 알리고, 전체를 상징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때문에 국립극장과의 공동제작 창작극 ‘심청’이 눈에 띈다.
개막공연 ‘심청’은 2023년 체결된 ‘공연문화예술의 증진을 위한 MOU’의 성과물이며,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무대에서 활동 중인 연출가 요나 김이 극본과 연출을 맡아 개막 전부터 기대감을 품게 했다.
작품은 시공을 초월해 경계를 넘나드는 해석으로 언어에 대한 이해 없이 전달되는 보편적인 감성을 담아냈다고 한다.
그러나 개막 5일 전, 리허설과 인터뷰에서 들은 연출가의 한마디는 의외였다.
“지금 작품은 진행 중이다. 아직도 찾아가는 중이고, 끝나지 않았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공연은 서울 공연에서 올려지고 나서야 아마 완성이 될 것 같다”
연출가의 말에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밖에 없었다. 이어진 설명은 분명했다.
초연은 이번 소리축제 개막공연으로 전주에서 이뤄지지만, 9월 초 서울 국립극장에서 네 차례 공연이 예정돼 있으며, 그즈음에야 결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주에서의 개막공연은 ‘완성작’이 아닌, 서울 무대를 준비하는 일종의 ‘연습’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되는 대목이었다. 관객이 본 무대가 예행연습인지, 세계소리축제만의 완결된 작품인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축제 개막공연의 의미는 단순히 프로그램 하나를 채우는 데 있지 않다. 수개월, 때로는 수년간 준비한 기획이 집약된 결정판이자, 관객과의 첫 만남을 여는 선언이 아닌가.
특히 세계소리축제처럼 지역과 세계를 잇는 행사의 경우, 그 상징성은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
‘현재진행형’이라는 표현은 창작 과정의 유연성을 드러낼 수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완성도를 희생한 채 ‘과정’을 무대에 올렸다는 인상을 줄 위험도 크다.
관객은 표를 사고, 시간을 내고, 기대를 품고 극장을 찾는다. 그 기대를 ‘나중에 완성될 것’이라는 말로 에누리하는 것은 무책임으로도 비칠 수 있다. 창작자의 자기표현 이전에 관객과의 약속 문제이기도 하다.
24년을 이어온 세계소리축제는 ‘첫 무대’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 개막공연이야말로 축제의 품격을 가늠한다. 전주에서의 초연이 진정한 ‘첫 공연’이었기를 바라는 마음이, 공연이 끝난 뒤에도 쉽게 가시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