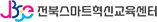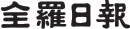AI 시대, 그 누구보다 먼저 경험한 이들이 미래를 선점하고 있다. 그러나 그 경험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전 세계에서 ChatGPT 유료 가입자 수는 미국에 이어 한국이 2위를 기록했다. 이는 우리 사회의 기술 수용 속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읽힐 수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엔 다른 그림자가 있다. 바로 교육의 디지털 격차다.
기술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은 여전히 소득 수준과 지역, 제도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은 유료 AI 툴은커녕 안정적인 인터넷 환경조차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공교육 현장에서도 ‘AI 기반 학습’이란 말은 들리지만, 정작 실질적 체험은 일부에 그친다.
미국의 최근 통계는 이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ChatGPT를 이용해 학습에 활용한 비율을 소득 수준별로 조사한 결과, 가구 소득이 연 $75,000 이상인 학생 중 35%가 AI를 적극 활용하는 반면, 소득 $30,000 이하 가정에서는 19%에 불과했다. 무려 2배 가까운 격차다. 비슷한 교육구조와 기술접근성을 가진 한국에서도 이러한 격차는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는 학창 시절, 당시로서는 보기 드문 컴퓨터가 설치된 학교에 다녔다. 그 경험이 오늘의 그를 만든 기반이었다. 우리 주변에도 아이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 이를 누구보다 먼저 활용한 이들이 새로운 직업군을 만들거나 창업에 성공한 사례가 적지 않다. 기술은 빠르게 진화하지만, 그 혜택은 먼저 체험한 이들의 몫이 되곤 한다.
지금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ChatGPT를 비롯한 생성형 AI 도구들을 활용해 자기만의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아이들도 있다. 그 격차는 단순한 ‘정보의 격차’를 넘어, 경험의 격차로, 결국엔 미래의 격차로 이어질 것이다.
일각에서는 "AI가 학생의 사고를 멈추게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게임에 몰입하는 아이들을 무조건 문제시했던 과거를 떠올려보자. 당시의 시선이 옳았다면 세계적인 E-스포츠 선수 '페이커'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기술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누구에게 경험할 기회를 줄 것인가에 따라 전혀 다른 미래를 만들어낸다.
이제는 공교육이 질문해야 할 때다.
“AI를 단순한 도구가 아닌,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만들 수 있는가?”
기술 그 자체가 불평등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누가, 언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하느냐가 문제다.
ChatGPT 시대, 우리는 단지 기술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미래를 만들고 있는가를 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