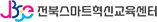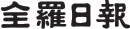/이춘구 언론인
전주·완주 통합논의를 지켜보면서 여러 생각을 갖게 된다. 완주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이나 군수, 도의원, 구의원 등은 통합논의조차 시도해보지 않고 통합에 반대하는 주장을 강하게 펼치고 있다. 통합운동단체들은 공식적으로 한 번도 논의해보지 않고 거세게 반대하는 모습을 보면 완주지역 정치 거버넌스는 지금처럼 분리된 상태의 지위나 권한을 유지하는 데 급급해 하는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전주·완주 통합을 추진하는 목적에 대해 근본적으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 김관영 지사가 7월 22일 전주·완주 통합을 공식화하면서 통합의 목적을 정의한 바가 있어 참고할 만하기에 그 일부를 인용한다.
김관영 지사는 “전주와 완주, 완주와 전주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누구의 편을 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기에 그렇습니다.”라고 선언했다. 전북자치도는 전주ㆍ완주 통합으로, ‘경쟁력 있는 자족도시 창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창출’, ‘자랑스러운 전주·완주 역사의 계승’이라는 세 가지 가치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가치를 통합 목표로 설정하고, 그 가치별로 세부 목표를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그동안 소홀히 다뤄졌던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대해 다뤄보도록 한다. 행정의 효율성은 효과성과 능률성을 말하는데 행정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대 편익을 분석하고 보다 큰 편익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전주ㆍ완주 통합은 기본적으로 행정통합이다. 행정통합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전주와 완주는 이미 ‘단일 생활권’이다. 많은 기능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데도 행정체계의 분리로 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비효율적인 공공투자도 문제이다. 완주군 이서면은 지역 내에서 섬처럼 고립되어 있고, 혁신도시는 도로 하나를 두고 시ㆍ군이 나뉘어 있다. 최근 삼봉ㆍ운곡지구 개발로 인구는 늘고 있지만 행정구역이 분리돼 있다. 생활 인프라가 있는 전주권까지 교통망 확충이 쉽지 않다. 전주와 완주는 같은 생활권에 살아가면서도 행정서비스와 정부 지원을 동등하게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라도 주민의 생활권과 경제권ㆍ교통권을 행정구역과 일치시켜 편안한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생각을 조금 더 발전시키면, 전주와 완주가 하나가 될 경우 통합청주시처럼 행정구를 2개에서 4개로 늘려야 한다. 35개 동, 13개 읍·면 체제를 바탕으로 통합시도 2개 구에서 4개 구로 늘려야 할 것이다. 필자 생각으로 후백제 궁성지이자 조선왕조의 발상지인 구도심을 일명 ‘태조구’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세종시와 대칭을 이루는 측면에서 ‘태조구’로 하자는 것이다. 남서부는 ‘완산구’, 북동부는 ‘덕진구’, 동부는 ‘완주구’로 하는 게 어떨까 제안해본다. 4개 행정구를 국회의원 선거구로 받아들이면 전북 전체적인 10개 의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행정의 효율성은 김관영 지사가 적시한 문제들을 하나씩 개선하는 데서부터 향상시킬 수 있다. 공무원 관리측면에서는 늘어나는 구청장 두 자리와 국장 자리 등을 완주군 출신 공무원에게 우선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승진과 보직 배치 등에서도 완주군 출신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규정으로 정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이 조직과 공무원 관리 등에서 합리성을 확보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군청이 폐지되고 구청이 두 개 더 생기게 되면 공무원 증원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만큼 더 행정의 효율성 증대 노력이 수반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
여기서 전주·완주 통합 시 행정효율성 제고 방안을 살펴본 것은 행정통합의 궁극적인 취지를 공유하기 위해서이다. 정부가 행정체제 개편을 시도하는 것도 같은 취지이다. 통합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여러 억측들을 널리 퍼뜨리면서 통합에 반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반대측 자료를 보면 일부 공무원은 반대측 편에 서서 행정통계 자료를 왜곡 해석하는 데 동조하는 것 같다. 공직을 맡고자 한 것은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데 봉사하려는 충성심 때문일 것이다. 처음 마음먹은 것처럼 좌고우면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게 충성의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