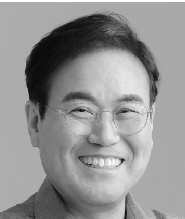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 더불어교육혁신포럼 이사장
조선시대 청렴한 관리의 호칭으로 염근리(廉謹吏)와 청백리(淸白吏)가 있다. 청백리는 잘 알지만, 염근리는 아마 생소할 것이다. 염근리는 고려와 조선시대에 능력을 갖춘 청렴결백한 관리에게 조정에서 내리는 녹선인데 뽑히는 절차가 까다로웠다. 동료들의 평가와 사간원, 사헌부는 물론 홍문관과 의정부의 검증까지 거친 후 선정이 됐다.
이렇게 관료가 염근리로 선정된 후 죽으면, 다시 평가를 해서 내리는 칭호가 청백리였다. 청백리의 요건이 탐욕의 억제, 매명행위의 금지, 성품의 온화함 등을 내세웠으니 이상적인 관료상이라 할 것이다.
연산군 때 잘못된 정사를 바로 잡기 위해 끊임없이 간언하다가 강음(江陰)으로 유배돼 그곳에서 생을 마감한 윤석보라는 선비는 중종 때 염근리로, 그리고 선조 때 청백리에 선정된 사람으로 유명하다. 그가 풍기군수로 있을 때의 일이다. 멀리 풍기까지 가야하니 처자식을 고향에 두고 혼자 임지로 떠났다.
군수로서 나랏일에만 힘쓰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으니 살림살이가 말이 아니었다. 굶기를 밥 먹듯 하던 가족들이 견디다 못해 토지를 장만해 자활하려고 했다. 그래서 집안 물건들을 팔아 밭 한 마지기를 샀다. 그 소식이 윤석보에게 전해졌다. 그는 가족들의 행위에 탄식하며 이렇게 말했다. ‘옛말에 공직에 있으면서 자신을 위해 한 척의 땅이라도 넓혀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국록 이외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내가 관직에 올라 국록을 받으면서 땅을 장만했다면,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그는 가족들을 설득하여 즉시 밭을 되팔도록 했다고 한다. 요즘 기준으로 그 정도면 너무한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다. 공직에 있으면서 저축해 좀 더 큰 아파트로 옮기고, 재산을 늘리는 것까지 비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보는 그 당시 부패가 만연돼 있어 스스로에게 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댔을 지도 모른다.
내가 대학에서 학장과 총장으로 있으면서 가장 중시했던 것은 구성원간의 신뢰를 토대로 대학의 내실을 기하고 위상을 높여 졸업생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었다.
또한 나는 학장으로 취임했을 때 응접의자가 길게 놓여있는 학장실을 교수들의 휴게실 겸 자료실로 내드리고 비좁은 부속실에서 학장업무를 수행했다. 교수들의 사기를 높여야 연구와 수업,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 대학의 보직을 맡으면서 재산을 늘리기는커녕 빚을 지기도 했다. 법대 학장이 되자마자 ‘법대 살리기’의 일환으로 사법고시 준비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 기금을 모금했다. 학장이 다른 교수들보다 솔선해야 했기 때문에 IMF 시기라서 모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당시로는 큰 액수의 빚을 내어 기금에 보탰다. 총장 때도 역시 대학발전기금 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빚을 내어 학장시절의 다섯 배 되는 금액을 쾌척했다. 비록 목돈은 없었어도 대학 발전이라는 대의를 위한 선택이었다.
가장이 국록을 먹고 있으니 가족들은 궁핍을 참아야 한다는 윤석보의 대쪽 같은 청렴에는 못 미칠지라도 나 역시 가족들에게 미안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왜 그래야 하는지 말을 안 해도 알고 지금도 나를 적극 응원하고 있으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청렴에는 궁핍의 그늘이 있다. 그러나 그 그늘은 분명 빛보다 더 밝은 희망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