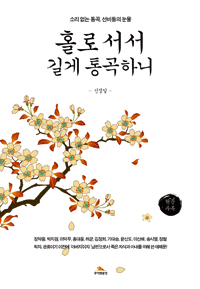
유학과 경전에 익숙한 지엄하고 체면을 중시했던 조선 선비의 인간적 슬픔을 책으로 만난다.
문화사학자이자 도보여행가 신정일이 펴낸 『홀로 서서 길게 통곡하니』는 사랑하는 자식과 아내, 가족, 벗, 스승의 죽음 앞에 미어진 가슴을 부여잡고 소리 없이 울었던 조선 선비들의 절절하고 곡진한 문장 44편이 담겨있다.
이 책은 ‘소리 없는 통곡, 선비들의 눈물’이라는 부제가 말하듯 조선이니, 유교니 하는 말을 완고하고 억압적인 가부장제와 동일시하기 십상인 우리에게는 매우 색다른 글들이 아닐 수 없다.
소설가 박완서는 외아들을 갑자기 잃고 난 후 부모의 슬픔을 기록한 글 <한마디만 하소서>에서 그 고통을 ‘참척(慘慽)’이라고 표현했다. 참척의 사전적 의미는 자손이 부모나 조부모보다 먼저 죽는 일을 뜻하지만 너무나 처절하고 참담해 가늠조차 안 되는 슬픔을 나타날 때 쓰인다.
그렇다면 체면을 중시하고 절제를 중시했던 조선 선비들은 과연 그 슬픔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사랑하는 자식과 아내, 형제자매, 벗, 스승 등 소중한 사람을 잃은 뒤 비어져 나오는 슬픔은 선비들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슬픈 가슴을 부여잡고 소리 없이 통곡했다.
“네가 떠난 뒤로 흙덩이처럼 방 안에 앉아 하루 종일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단다. 앉아서는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나가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구나. 혹은 책을 펼쳐놓고 한숨을 내쉬고, 혹은 밥상을 앞에 놓고 탄식하며, 혹은 그림자를 보며 중얼거리기도 한단다. 산을 보아도 네가 떠오르고, 물가에 가도 네가 떠오르며, 평대의 솔바람 소리를 들어도 네가 떠오르고, 달밤에 작은 배를 보아도 네가 떠오르니, 언제 어디서나 모두 네 생각뿐이로구나. 하지만 너의 자취는 이미 연기처럼 먼지가 되어 사라졌으니, 찾아도 보이지 않고 구해도 얻을 수가 없구나.”
조선 후기 평론가로 이름을 날린 이하곤이 맏딸 봉혜의 죽음을 맞아 통곡하며 쓴 <곡봉혜문>의 일부이다. 그는 갑작스런 여섯 살짜리 딸아이의 죽음 앞에 “심장이 찔리고 뼈가 깎이는 참혹한 고통”이라는 통절한 표현을 썼다.
다산 정약용 역시 네 살짜리 막내아들의 갑작스런 죽음 앞에 “간장을 후벼 파는 슬픔”이라며 참척의 아픔을 토로했다. 여기에는 지엄하고, 체면을 중시했던 선비가 아닌 아픈 자식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한 아버지로서의 애절함과 비통함이 가득 담겨 있다. 이는 익히 우리가 알고 있던 선비들의 모습과는 완연히 다르다. 그들은 슬픔을 좀체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슬픔을 애써 삭이며 마음속으로만 울어야 하는 절제를 미덕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가슴속에 똬리를 튼 애통함은 어찌할 것인가.
신정일은 “체면을 중시했던 선비들이 아닌 따뜻한 마음을 지닌 아버지이자 한 인간으로 돌아가 자식과 아내, 가족, 벗의 죽음을 통곡햇던 선비들의 글을 모았다”며 “지엄한 선비가 아닌 한 인간으로서 맨얼굴을 한 선비들의 감춰졌던 속마을과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344쪽. 루이앤휴잇 15,800원.
/이병재기자·kanadasa@


